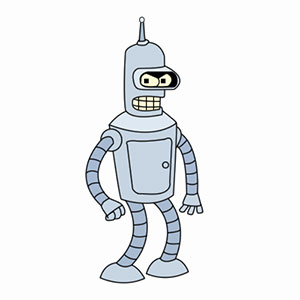'아리조나 유괴사건'에서 아리조나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이 펼쳐진 미국의 행정 구역이 아니라 사람 이름으로 쓰인 것처럼 이 영화 제목의 섬머 역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절 ㅡ 이제 그 시기는 우기(雨期)라고 불리는 편이 더 나으리라 ㅡ 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다.
그런 면에서 '500일의 여름'이라고 번역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영화를 보면서 알랭 드 보통의 사랑 소설을 영화화한 것 같은 느낌을 꾸준히 받았는데 어이쿠, 하필 건축을 전공한 컨셉의 남자 주인공이 '행복의 건축'을 읽는 장면이 나오다니.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텍스트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건가.
어쨌든 이 영화는 꽤 볼만한 로맨스 영화다.
대개 서사적으로 진행되는 남녀간 사랑 이야기를 비서사적인 방법으로 서술하니 꽤 신선했다.
궁극적인 결과는 모른 채 계속 위로 떴다가 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는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스릴있더라.
그렇게 잘생기거나 그렇게 예쁘지 않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로맨스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와 비슷하게 오묘한 현실성이 느껴진다.
남자 주인공을 연기한 조셉 고든-레빗은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이 낯이 익었는데 무려 '브릭'의 주인공이었다.
담담한 얼굴로 전혀 담담하지 않은 캐릭터를 잘 연기했다.

여자 주인공은 주이 디샤넬이 연기했다.
아주 짜증 돋게 하는 전형적인 감 잡을 수 없는 여자 역할에 참 어울렸다.
원래 그녀의 성격이 반영된 이른바 '생활 연기'였을까?
왠지 생김새가 느낌이 안 좋은 여자 같기는 하다만…….
하지만 유언비어는 나쁜 어린이만 하는 것이므로 스탑.
요새 들어 유난히 주목을 많이 받는 '힛걸' 클로이 모레츠도 나온다.
역시나 진부한 캐릭터인 비정상적으로 성숙한 여동생 역할이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캐스팅이다.
'최고의 가성비'라는 묘사를 할 수 있겠다.
줄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잘 놀고 부비부비 하다가 삐끄덕거리면서 헤어진다는 이야기므로 생략하자.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자들이 이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다.
저런 영화 속의 여자상에 대해 현실의 여자들은 얼마나 공감을 느낄까.
이런 의문은 왠지 대답이 '많이 많이'일 것만 같다고 느낀 나의 분노와 관련이 있으리라.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언제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해받길 바라고 옹색하며 고집쟁이다.
후반부에 톰과 서머가 만나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톰이 말한 대로 정말 'I'll never understand that'이다.
만약 여자들이 저런 캐릭터에 많은 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모두 미디어의 잘못이다.
가구 쇼핑몰에서 부부 행세하는 놀이에 장단을 맞춰주고 팔에다 멋진 그림을 쓱쓱 그려내고 '자지' 또는 '고추'를 외쳐대는 여자를 받아주는 그런 선하고 멋진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
많은 여자가 꿈꾸겠지만 사실 그런 남자도, 그런 사랑법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로맨스 영화에 그런 '영화 같은' 요소가 빠지면 너무도 밍밍할 것이기 때문에 삽입된 '영화 같은' 요소에 현혹되지 말자.
우리는 영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경험을 통해 사랑에 익숙해지면 두 사람의 관계를 '사귄다'고 하거나 '연인 관계' 같이 규정짓는 것이 진부하고 유치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소해보이는 '사귀는 사이'라는 이름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표 없이는 장기적인 연애가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연인으로 인식하며 만나게 되는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그런 관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애 초반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랑의 양(量)의 시소가 팽팽한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소가 어떤 계기로든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불안을 먼저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나서게 된다.
그 방법 중 가장 쉽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두 사람의 관계에 그 진부한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다.
그 간단한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겁쟁이거나 야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500일의 썸머'에 나오는 두 남녀는 겁쟁이거나 야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남자는 겁쟁이고 여자는 야비하다.
그 겁쟁이과 야비한 사람이 영화의 결말에서 서로의 사랑 철학을 이해하게 된다.
아니 어쩌면 서로 맞바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엔딩이 꽤나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겠지.
적당한 오글거림과 적당한 진지함이 섞인 괜찮은 영화.
그런 면에서 '500일의 여름'이라고 번역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
|||||||||||
영화를 보면서 알랭 드 보통의 사랑 소설을 영화화한 것 같은 느낌을 꾸준히 받았는데 어이쿠, 하필 건축을 전공한 컨셉의 남자 주인공이 '행복의 건축'을 읽는 장면이 나오다니.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텍스트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건가.
어쨌든 이 영화는 꽤 볼만한 로맨스 영화다.
대개 서사적으로 진행되는 남녀간 사랑 이야기를 비서사적인 방법으로 서술하니 꽤 신선했다.
궁극적인 결과는 모른 채 계속 위로 떴다가 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는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스릴있더라.
그렇게 잘생기거나 그렇게 예쁘지 않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로맨스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와 비슷하게 오묘한 현실성이 느껴진다.
남자 주인공을 연기한 조셉 고든-레빗은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이 낯이 익었는데 무려 '브릭'의 주인공이었다.
담담한 얼굴로 전혀 담담하지 않은 캐릭터를 잘 연기했다.

'브릭'에 나온 조셉 고든-레빗.
여자 주인공은 주이 디샤넬이 연기했다.
아주 짜증 돋게 하는 전형적인 감 잡을 수 없는 여자 역할에 참 어울렸다.
원래 그녀의 성격이 반영된 이른바 '생활 연기'였을까?
왠지 생김새가 느낌이 안 좋은 여자 같기는 하다만…….
하지만 유언비어는 나쁜 어린이만 하는 것이므로 스탑.
요새 들어 유난히 주목을 많이 받는 '힛걸' 클로이 모레츠도 나온다.
역시나 진부한 캐릭터인 비정상적으로 성숙한 여동생 역할이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캐스팅이다.
'최고의 가성비'라는 묘사를 할 수 있겠다.
줄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잘 놀고 부비부비 하다가 삐끄덕거리면서 헤어진다는 이야기므로 생략하자.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자들이 이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다.
저런 영화 속의 여자상에 대해 현실의 여자들은 얼마나 공감을 느낄까.
이런 의문은 왠지 대답이 '많이 많이'일 것만 같다고 느낀 나의 분노와 관련이 있으리라.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언제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해받길 바라고 옹색하며 고집쟁이다.
후반부에 톰과 서머가 만나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톰이 말한 대로 정말 'I'll never understand that'이다.
만약 여자들이 저런 캐릭터에 많은 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모두 미디어의 잘못이다.
가구 쇼핑몰에서 부부 행세하는 놀이에 장단을 맞춰주고 팔에다 멋진 그림을 쓱쓱 그려내고 '자지' 또는 '고추'를 외쳐대는 여자를 받아주는 그런 선하고 멋진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
많은 여자가 꿈꾸겠지만 사실 그런 남자도, 그런 사랑법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로맨스 영화에 그런 '영화 같은' 요소가 빠지면 너무도 밍밍할 것이기 때문에 삽입된 '영화 같은' 요소에 현혹되지 말자.
우리는 영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경험을 통해 사랑에 익숙해지면 두 사람의 관계를 '사귄다'고 하거나 '연인 관계' 같이 규정짓는 것이 진부하고 유치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소해보이는 '사귀는 사이'라는 이름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표 없이는 장기적인 연애가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연인으로 인식하며 만나게 되는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그런 관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애 초반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랑의 양(量)의 시소가 팽팽한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소가 어떤 계기로든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불안을 먼저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나서게 된다.
그 방법 중 가장 쉽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두 사람의 관계에 그 진부한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다.
그 간단한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겁쟁이거나 야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500일의 썸머'에 나오는 두 남녀는 겁쟁이거나 야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남자는 겁쟁이고 여자는 야비하다.
그 겁쟁이과 야비한 사람이 영화의 결말에서 서로의 사랑 철학을 이해하게 된다.
아니 어쩌면 서로 맞바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엔딩이 꽤나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겠지.
적당한 오글거림과 적당한 진지함이 섞인 괜찮은 영화.
'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Pod Shuffle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0) | 2011.08.28 |
|---|---|
| Weezer <Pinkerton> (2) | 2011.08.28 |
| The Feeling <Together We Were Made> (5) | 2011.08.27 |
| Arcade Fire - Sprawl II (Mountains over mountains) (1) | 2011.08.25 |
| Lenny Kravitz - Little girl's eyes (0) | 2011.08.24 |
| 네이버 음악 이 주의 발견 - 국내 앨범 8월 넷째 주 40자평 (3) | 2011.08.20 |
| 바람직한 음악 감상법 5 (0) | 2011.08.20 |
| 1984 (0) | 2011.08.19 |
| 바람직한 음악 감상법 4 (0) | 2011.08.14 |
| Maroon 5 B-Side 트랙의 좋은 예, 나쁜 예, 이상한 예 (5) | 2011.08.14 |